
시집 한 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랑 노래’.
한국문단의 대표적 서정시인인 문충성의 스물한 번째 시집입니다.
시인은 우리나이로 일흔 여덟입니다. 문학세계에서든, 세상살이에서든 존경해 마지않아야 할 원로(元老)입니다.
그의 스물한 번째 시집은 이러한 세속적 연치(年齒)를 거부한 치열한 시작업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시집에 수록된 시가 1천 여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작(多作)이지요. 시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학평론가 김진하는 시집 해설에서 문충성을 ‘문단의 조류와 무관하게 오로지 자기만의 노래를, 영혼의 노래를 줄기차게 불러온 시인’이라 했습니다.
다작 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만한 생산성이나 안이한 감상에 빠진 통속적 시인으로 불리어지는 오해를 경계한 것입니다.
시 작업에서 나이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요새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도저(到底)한 시인의 문학적 감수성이나 상상력, 아름답고 진솔한 감성을 다스려온 치열함은 아무나 흉내 내지 못할 그만의 시혼(詩魂)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문충성(文忠誠)입니다. 이름의 한자를 풀어쓰면 ‘글에의 충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글 써서 살아야 하는 팔자인 셈이지요.
생의 5할 이상을 시에 충성(忠誠)해온 그의 ‘시 밭갈이’도 이러한 팔자소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미리 고백하건데 이 글은 시적 사유(思惟)나 문학적 소양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순전히 ‘개인적 감상의 잡글’ 입니다.
전문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범속(凡俗)한 독자의 주절거림 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시를 읽으면서 문득 숲속의 옹달샘을 떠올리는 것도 문외한의 얄팍한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옹달샘은 낮에는 눈 시리게 파란 하늘과 눈 맞추며 숲의 푸른 정기와 스치는 연록의 바람소리에 귀를 엽니다.
이파리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을 다스리고 재잘거리는 새들과 입 맞춰 노래하기도 합니다.
밤이면 쏟아지는 달빛과 별빛을 보듬어 더욱 맑고 푸른 샘물을 걸러내는 옹달샘.
그렇습니다. 스물한 번째 시집을 출간한 시인의 시혼도 이처럼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숲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할 것입니다.
거기서 제주바다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너도 건너도 건너지 못하는 아스라한 수평선과 이승과 저승사이의 구름다리도 보았을 터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구름과 달빛과 꽃과 풀잎의 노래를 켜켜이 쟁이고 절절한 그리움과 아픈 사랑이야기도 두레박 넘치게 퍼올 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T.S 엘리어트를 인용하자면 ‘시는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도피이고,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했습니다.
‘감정과 개성을 다스린 진실 되고 깨끗한 마음의 표현이 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는 한마디로(一言而蔽之), ‘사무사(思無邪)’라고 했던 공자(孔子)의 말씀도 이와 무관치가 않습니다.
‘생각에 거짓이나 사악함이 없는 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문충성의 시도 그렇다고 합니다. 재기발랄한 비유를 동원하면서도 언어를 농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진무구(純眞無垢)가 시의 바탕이어서 그렇습니다.
죽음과 허무를 노래하면서도 명징(明澄)한 영혼의 울림은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빼어난 글쟁이 송상일(문학평론가)은 문충성의 시어(詩語)에 대해 ‘종소리처럼 뇌리를 하얗게 울리는 격조 높은 비유’라고 찬사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바탕은 ‘제주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소금기 절었던 유년의 추억을 낚아 올리고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상상의 구름다리와 무지개를 노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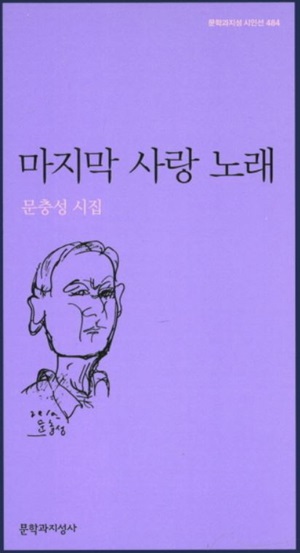
그의 시편 곳곳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제주바다와 수평선과 이승과 저승을 교묘하게 고리 짓는 유년의 추억일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랑 노래’에서도 예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에 대한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머니의 하늘을 생각하면서, 가을과 구름을 노래하면서, 허무와 죽음의 시적 상상력을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죽음에 대한 시적 상상력은 ‘죽음의 찬미’가 아닐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겠지요. 기다리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예비하면서, 죽음을 연습하면서, 언젠가 열릴 새 하늘을 기다리면서 짜 올리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갈증과 갈망의 노래일 것입니다.
미완성의 사랑에 대한 절박하고 애절한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위어 드는 꿈의 불씨를 되 살린다’는 책머리 시인의 말은 ‘마지막 사랑 노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사랑 노래’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분명, 절제된 언어 예술의 연금술사로서, 삭막한 세상 감정의 조련사로서 새롭게 진실을 노래 할 것입니다.
상식과 양심이 뒤틀린 세속에서도 시인의 쏘아 올리는 진실의 언어는 우렁우렁 시대를 울릴 것입니다.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라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 노래’가 아니라 스물두 번째의 ‘새로운 사랑 노래’를 듣고 싶은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글이 시인이 이뤄놓은 문학적 성취에 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육을 아름답게 다스려 건강하십시오. 건필(健筆)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