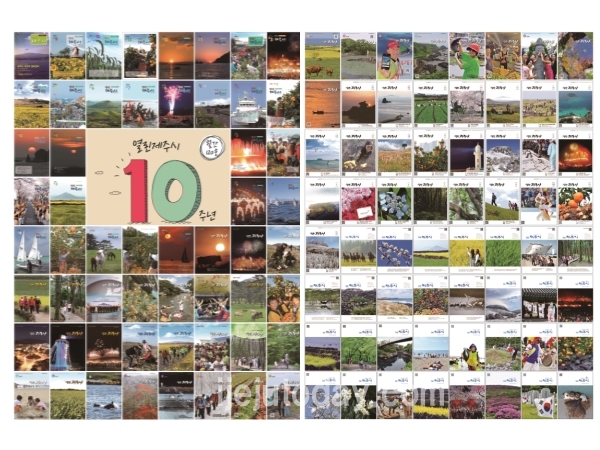
자그만치 10년이다.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60쪽에 달하는 ‘잡지’를 그만한 세월동안 이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만고만한 내용들로 ‘쉽게’ 이어오진 않았다. 외주를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원이 되고 사진기자가 되고 나름 ‘베테랑’ 편집인이 다 됐다. 어디 중견의 출판사 얘기가 아니다. 이달로 120호를 발간한 제주시 ‘소식지’이야기다.
제주시 소식지가 ‘책자’로 발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신문지 형태였던 것을 책자로 발간했다. 1호부터 나름 편집장을 맡아온 제주시청 공보실 강봉수 담당은 북군청 시절부터 공보담당으로 안 만져본 ‘책’이 없었단다.

“올해로 26년째 공보담당으로 소식지며 책자를 만들어 왔어요. 내 나름 자신감이 있어서 제주시로 오면서 소식지를 ‘책자’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가 소식지의 제1원칙으로 삼은 건 ‘시민소통’이었다. 시정소식은 소식지의 뒤로 내용을 밀어놓고 시민들이 사는 삶의 이야기를 전면에 담아왔다. 처음 발간시 40쪽 분량 7000부였던 소식지가 1년이 지나면서 56쪽 분량 8000부로 분량도 부수도 늘어난 건 그런 나름의 소신이 ‘통(通)’했기 때문이다.
“8000부 중에 우편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6100부 가량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은 곧, 그들을 시와 연결시키는 ‘네트워킹’이 됐죠. 그렇게 알려진 ‘소식지’는 직접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와 구독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단기간에 부수도 늘어나고 나름 반응도 좋습니다. 이제는 1만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식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점자로도 오디오북으로도 다양하게 발간된다. 점자와 오디오북은 2008년 7월호부터 발간됐고, 지난 2012년부터는 e-book으로도 소식지를 읽을 수 있게 됐다. 누구도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한다는 소신이 반영됐다.
어려운 점이 없진 않다. 기획연재 일부는 외부 기고를 맡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식지 내용은 공보실 직원들이 ‘직접’ 취재해 채운다. 마감일에 쫓기기도 하고 ‘아이템 발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관청이 ‘외주’로 소식지를 만드는 반면 제주시 소식지는 한 번도 외주를 준 일이 없다.
“숨 쉬듯 해온 일이에요. 매달 반복되는 일이지만 허투루 내용을 채워본 적은 없죠. 처음 적응하는 직원들은 원고 쓰고, 사진 찍고, 취재하는 일이 어렵긴 해도 3-4개월 지나다보면 ‘사명감’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이 매달 그만한 분량의 내용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아요.”
지난 선거 때는 홍보물 발간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식지가 끊길 뻔 했다. 그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시정 홍보 내용은 모두 빼고 ‘시민들의 이야기’로만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소식지 명맥을 이었다.
“정기간행물로 매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지인데, 한 번 두 번 이런 저런 이유로 끊기면 독자의 신뢰를 잃는 것이죠. 나름의 알찬 내용을 매번 정해진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식지가 처음처럼 지금도 이어올 수 있는 이유인 셈입니다.”

10년을 정기간행물로 ‘100% 자체제작’ 해오면서 부딪히는 한계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비슷한 아이템이 ‘중복’ 될 수 있고 시기를 놓치는 아이템도 있다. 나름 발로 뛰어 취재한 내용이 소식지에 실리지 못할 때도 있다. 때문에 편집회의 때마다 그간의 소재들을 묶은 ‘목차’는 필수 확인 요소다. 매너리즘에 빠질 듯 하면 ‘자신의 일을 기록’하는 사명감을 직원들에게 상기시킨단다.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는 10년이 지나도 늘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요.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 게 아쉬울 뿐이죠. 때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다른 부서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을 보고 눈과 귀를 열어두라 합니다. 지금은 힘에 부쳐도 훗날 돌아보면 ‘자신이 직접 발로 뛴 일’이 기록으로 남는 것에 사명감을 갖도록 격려하죠.”
취재원이 되고, 편집인이 되고. 작가가 되고 기자가 되고. 소식지 120회 10년의 기록은, 제주시 소식지 담당 공보실을 ‘작은 출판사’로 만들었다.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크고 작은 정보들로 56쪽이 채워진 ‘소식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책이지만, 그에 담긴 나름의 ‘소신’과 ‘사명감’을 한번쯤 격려해 볼 때다. 앞으로 10년 후, 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하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