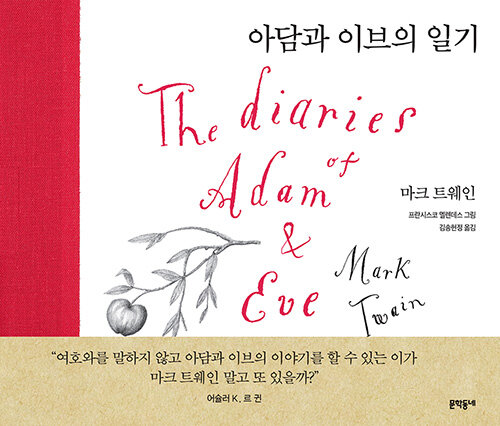
마크 트웨인 작, 프란시스코 멜렌데스 그림, 김송현정 옮김, 문학동네
마크 트웨인의 《아담과 이브의 일기》를 집어들면서 제일 먼저든 생각은 마크 트웨인은 불행한 작가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이른바 ‘어린 시절의 도서 목록’에 갇혀서 정작 성인들에게는 읽히지 않는 작가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나이가 들어 톨스토이를 다시 읽는 것과 마크 트웨인은 다시 읽지 않는 것의 차이랄까? 세대를 견디며 늘 읽히는 작가이지만 한 번 읽으면 다시 읽히지 않는 작가? 나의 사례를 너무 확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식민 시절 일본을 통한 세계문학의 수입이 빚어낸 하나의 풍경일까? 마크 트웨인, 참 묘하다.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며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나라 잃은 남자일세. 리비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나의 나라였네.”
널리 알려진 묘한 이야기 하나. 하나님이 만든 동산, 이른바 낙원에서 사는 최초의 인간들이 있다. 남자와 여자다. 아담과 이브. 이들은 짝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리고 그 벌로 낙원에서 쫓겨난다.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원죄를 타고 난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로 만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할 거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잘못 하신 거네요!”
말인즉슨 맞는 말 아닌가. 불손한 유머가 되겠지만, 마치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따지는 것처럼 ‘몇 대 몇’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책 읽는 사람들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자가당착 혹은 자기모순에 빠지신 하나님을 연민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금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위반이 있다는 신화나 전설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또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 가치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
마크 트웨인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신이라는 명사를 삭제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맞지만, 그 둘 중 누구도 신이라는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 신이라는 존재의 그림자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창세기에서처럼 사과와 뱀이 등장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모티브도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이브의 사랑이다.
아담과 이브, 곧 남녀의 알콩달콩, 티키타카 러브 라인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마크 트웨인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멜로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아담의 입장(<아담의 일기>)에서 한 번, 이브의 입장(<이브의 일기>)에서 한 번씩 펼쳐진다.
“이 긴 머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주 거치적댄다. 항상 얼쩡거리며 나를 졸졸 따라다닌다. 나는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도 않거니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어색하다. 그것이 다른 동물들하고 지내면 좋겠다.”(<아담의 일기> 中) 아담이 이브에 대해 처음 꺼내놓은 말이다.
반면 이브가 내놓은 아담에 대한 평은 이렇다. “그것은 취향이 저속하고 인정이 없다······그런 짓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일까? 그것은 감정도 없나? 저런 작은 피조물에 대한 연민도 없나? 그것은 그런 거친 짓을 하도록 계획되고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그렇게 생겼다.”(<이브의 일기> 中)
최초의 인간들이 벌이는 최초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다른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원초적 모습과 풍경들이 새겨진다. 신화적 상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때로는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과정들을 재생, 아니 초연初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 사랑은 재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늘 초연이어야 마땅한 그 무엇이리라. 그 사랑의 과정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읽으면 다른 종류의 이야기도 가능할 듯 하다. 누군가 그랬으면 좋겠다.
숨겨진 하나의 에피소드. 마크 트웨인은 <아담의 일기>를 쓰고 나서 몇 년 후 <이브의 일기>를 썼는데, 그 두 편 사이에 딸과 아내의 죽음이 있었다.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며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나라 잃은 남자일세. 리비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나의 나라였네.” 이 말은 <이브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 된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에덴동산이었노라.”
이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한 번 마크 트웨인을 읽었다. 마크 트웨인은 한 가지 점에서는 행복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사랑이 최초의 사랑과 다를 바 없음을, 세상에 초연된 그 찬란한 사랑이었음을 말할 수 있었으니. 나는 문득 나의 이브가 궁금해졌다.

'한뼘읽기'는 제주시에서 ‘금요일의 아침_조금, 한뼘책방’을 운영하는 노지와 삐리용이 한권 혹은 한뼘의 책 속 세상을 거닐며 겪은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다. 사전적 의미의 서평 즉, 책에 대한 비평보다는 필자들이 책 속 혹은 책 변두리로 산책을 다녀온 후 들려주는 일종의 '산책담'을 지향한다. 두 필자가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관련기사
- [한뼘읽기]“당신 인생 위해, 주는대로 드셔!”
- [한뼘읽기]붕어야, 정말 미안!
- [한뼘읽기]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아직 몰라서
- [한뼘읽기]'좋아요'를 부탁합니다!
- [한뼘읽기]사랑과 동업 사이에 낀 내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
- [한뼘읽기]우아하고 감상적인 '똥뽈'축구
- [한뼘읽기]베트남 전쟁은 헬리콥터 타고 아버지를 데리러 온다
- [한뼘읽기]빵빵한 세상
- [한뼘읽기]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 [한뼘읽기]독립군들 다 모여라, TATA!
- [한뼘읽기]장래희망은 사이보그 할머니
- [한뼘읽기]봅써 이 자파리 해 논 거!
- [한뼘읽기]믿습니까? 믿습니다!
- [한뼘읽기]어슐러 K. 르 귄의 깃발, 함께 드실 분?
- [한뼘읽기]아내를 고발합니다
- [한뼘읽기]아버지의 사전과 하녀
- [한뼘읽기]안녕, 마르크스
- [한뼘읽기]병든 여우의 즐거운 숲
- [한뼘읽기]엔니오의 위트
- [한뼘읽기]무라카미 혼쭐내기
- [한뼘읽기]친애하는 나의 플라스틱 시대여
- [한뼘읽기]사랑해! 안 돼! 넌 내거야!
- [한뼘읽기]슈퍼맨의 비애와 아무튼 쓰레기
- [한뼘읽기]위선 좀 떨며 삽시다
- [한뼘읽기]글을 이기는 싸움
- [한뼘읽기]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 [한뼘읽기]숏컷이었구나?!
- [한뼘읽기]레시피가 문제지, 내 요리가 무슨 죄람
- [한뼘읽기]개처럼 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