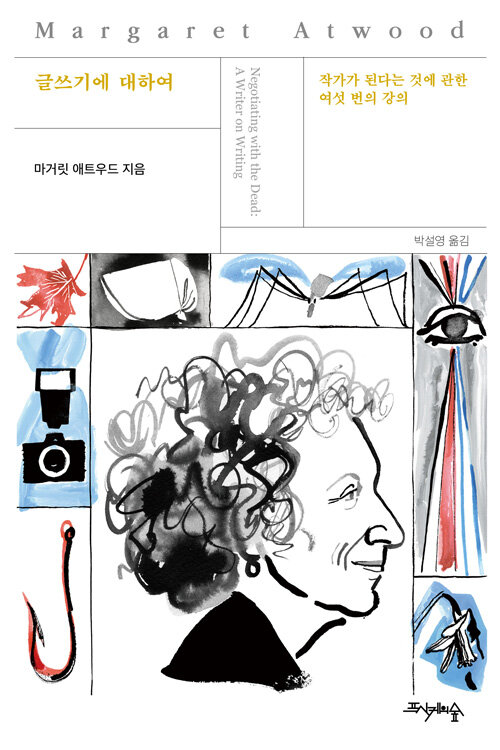
《글쓰기에 대하여》 마거릿 애트우드 지음, 박설영 옮김, 프시케의 숲
한두 해 전부터 마거릿 애트우드의 책을 모으고 있다. 그녀의 작품이 국내에서도 꽤 관심을 끄는지 올 상반기에도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공교롭게도 두 권 모두 글쓰기에 관한 책이다. 《Negotiating with the Dead: A Writer on Writing (2002)》이 《글쓰기에 대하여-작가가 된다는 것에 관한 여섯 번의 강의》라는 이름으로, 《In Other Worlds: SF And The Human Imagination (2011)》이 《나는 왜 SF를 쓰는가-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출간됐다. 이 두 권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아마 또 한 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On Writers and Writing (2015)》라는 책도 글쓰기와 관련한 그녀의 저서 목록에 있기 때문이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글쓰기에 대하여》를 읽다보면 그녀가 펼쳐보이는 방대한 서브 텍스트들에 놀라게 된다. 그녀는 작가이기에 앞서 엄청난 독자임이 분명하다. 작가란 무엇인가, 독자란 무엇인가 등등 사실 그리 낯설지 않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마거릿 애트우드는 학술적인 접근이나 실용적인 접근 대신, 자신이 읽은 책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시와 소설 속 인물들이 말하고, 작가들이 말하고, 시대 상황이 말을 한다. 그것들을 읽다보면, 적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묘하게도 박완서를 읽는 기분이 든다. 아무렇게나 펼친 페이지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보면 이렇다.
다니엘(조지 엘리엇의 소설 《다니엘 데론다》의 주인공)의 엄마는 마녀라고도 불립니다. 마녀와 팜 파탈femme fatale은 한 끗 차이로, 19세기 말에는 수십 명의 팜 파탈이 무대 위를 어지럽혔어요.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살로메입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줄넘기 노래에서였어요. “살로메는 춤꾼, 야한 춤을 즐겨 췄지. 야한 춤을 출 때면 옷을 별로 걸치지 않았지.” 예술 작품으로는 플로베르의 <살로메>(단편소설),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희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오페라)를 비롯해, 다양한 그림들이 살로메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프루프록이 자신의 머리가 쟁반 위에 놓일 것을 내다보는 구절에서 가리키는 것도 살로메이지요. 그녀의 매력은 뭘까요?
소설과 지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엮여있다. 그녀의 글은, 조금 멋을 부려 표현해보면, 독자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정작 그녀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은 적어도 디테일 면에서는 충분하고도 남으리라 짐작된다. 마거릿 애트우드라는 이름 밑에 다시 한 번 밑줄을 긋는다.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이 쓴 글쓰기에 관한 산문들은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 오에 겐자부로와 조지 오웰의 에세이도 그래서 한참을 책꽂이에 꽂혀만 있다.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 시간 그렇게 되리라.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의도적이다. 반면에 책에 대한 책은 몹시도 좋아하는 편이다. 아예 책꽂이에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둘 정도다.
책을 다루거나 작가가 등장하는 소설, 혹은 책에 대한 담론들도 좋다. 이것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지도 한참 됐다. 오랜 로망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작가가 쓴 책에 대한 에세이는 내치면서 책에 대한 글은 좋아하는, 어쩌면 이중적이면서 모순적인 이 태도는 뭘까?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본다. 오래 생각한다. 아, 알겠다. 작가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왜? 어떻게?
나는 작가가 아니다. 어쩌다 삶의 파고에 밀려 지금까지 글 쓰는 일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지만, 나는 작가가 아니다. 아주 짧은 순간 작가가 되려고 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야말로 충동적이고도 찰나적인 생각에 불과했다. 모자란 재주와 모난 감수성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작가보다 평론가가 되고 싶어졌다. 깜냥이 안 돼 상상의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만들어진 상상의 세계나마 잘 이해하고 즐기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을 쓰고 싶었다. 그렇게 상상을 공유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거친 문학적 공생을 꿈꿨다. 평론가를 “작품에 빌붙어 먹고 사는 빈대 같은 존재”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지만, 평론의 매혹은 최선이자 더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읽고, 썼다. 하지만 작가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 글쓰기를 말하는 책은, 마치 발에 채이는 돌부리처럼, 늘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냐?”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은 작품이지 작가가 아니다. 그러나 작가가 쓰는 글쓰기 책은 작가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삭제될 수 없는 작가라는 존재가 못내 불편한 것이다. 작가이지 못한 나는 평론이라는 미명 하에 상상의 매혹을 과연 잘 살았는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의 매혹에 나의 매혹을 덧붙일 수 있었던가? 아, 차라리 답하지 말자! 침묵하자! 그게 최선의 답이다. 오래된 욕망이 나는 불편하다. 상상의 선주민先住民인 작가들이 나는 늘 불편하다.

'한뼘읽기'는 제주시에서 ‘금요일의 아침_조금, 한뼘책방’을 운영하는 노지와 삐리용이 한권 혹은 한뼘의 책 속 세상을 거닐며 겪은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다. 사전적 의미의 서평 즉, 책에 대한 비평보다는 필자들이 책 속 혹은 책 변두리로 산책을 다녀온 후 들려주는 일종의 '산책담'을 지향한다. 두 필자가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