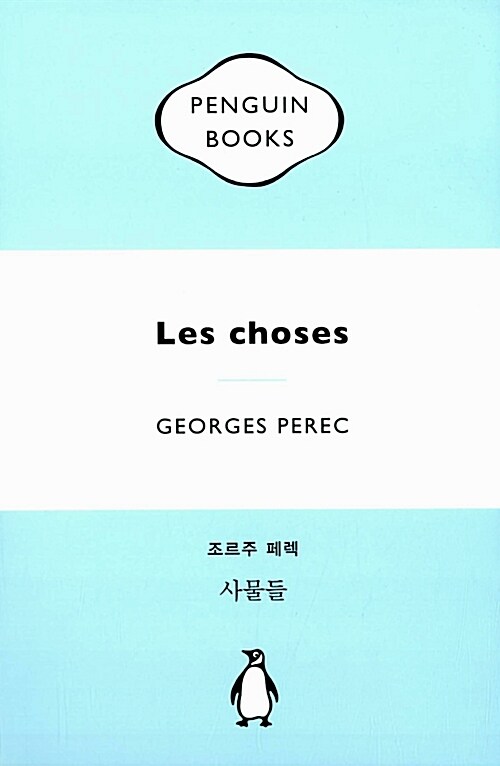
“이리 나와 봐!”
며칠 전 아침, 나를 불러대는 남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 그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다. 빈티지 토분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투박하고 거친 것이 빈티지라고 우겨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웠어?"라고 묻긴했지만 뻔히 짐작됐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 동네 클린하우스!"
남편은 버려진 것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내는 일에 좀 재능이 있는 편이다. 나는 버려진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는 일에 심정적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버려지는 것들 가운데는 아직 쓸 만한 것들이 곧잘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나름의 오리지널리티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다른 동네 친구들에게 제보 전화도 온다. 자기들 집 앞에 뭐가 버려져 있다고, 얼른 와 보라고! 서점에 있는 책 매대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제보 받아 주워온 재봉틀로 만든 것이다. 주워오는 물건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은 쓰던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집에 있는 것들 중에는 나만큼 나이를 먹은 것들이 꽤 있고, 우리 부부는 그것들이 나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기를 바란다. 이를 테면, 1960년대에 나의 노모가 선물 받았던 밥그릇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50년쯤은 더 견뎌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맥시멀리스트다. 세상이 미니멀리즘에 홀려, 설레지 않는 건 버리라는 곤도 마리에의 정언명령에 따라, 버리고 또 버릴 때, 그래서 삶을 가볍게 만드는 데 힘을 쏟을 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쟁여둔 물건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게 고작이었다. 버린 것도 있긴 있다. 비디오테이프. 세상이 넷플릭스와 유트브를 중심으로 굴러가게 될 줄 몰랐던 시절에 남편은 보고 싶은 영화들과 이미 보았던 영화들의 테이프를 사 모으는 게 일이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이 나서 거드는 쪽이었다. 그것들을 쌓아 간이침대를 만들었던 일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버리면서 시대를 인정했고, 남편은 나를 변절했다고 원망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책이다. 읽은 것들과 안 읽은 것들, 심지어는 읽을 가능성이 없는 것들까지 나란히 책장에 꽂혀 있다. 어떤 날들은 그것들의 위용에 감탄하고, 어떤 날은 그것들이 허세의 진열장 같아서 민망하다. 또 어떤 날은 그것들이 감옥 같기도 하다.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물들이 다 그렇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에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 커플 실비와 제롬이 상상하는 자신들의 공간의 풍경이 등장하는데,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책으로 둘러싸인 벽들 사이에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물들에 둘러싸여, 멋지고 단순하며 감미롭게 빛나는 사물들 사이에서, 삶이 언제까지나 조화롭게 흘러가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삶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다. 홀연히 모험을 찾아 나서기도 할 것이다. 어떤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원한이나 쓰라림, 질투를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소유와 욕망은 언제나 모든 지점에서 일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균형을 행복이라 부를 것이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명하고 고상하게 행복을 지키고, 그들이 나누는 삶의 매 순간 이를 발견할 줄 알 것이다.”
1960년대 프랑스 부르주아의 삶을 시험하는 인물로서의 제롬과 실비의 욕망과 맥시멀리스트로서의 우리의 삶 사이에는 ‘사물들’이라는 하나의 교점이 있지만, 우리의 사물들은 우리가 얼마나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우리는 곧잘 소유와 욕망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삶을 원망하고 쓰라려 하고 질투하곤 했다. 맥시멀리스트로서 우리의 삶은 때론 시간을 견디는 나름의 절박한 방식으로 존재했다. 가령 책을 소유함으로써, 그 책을 관통하여, 책 너머의 삶까지 살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비디오테이프를 소유함으로써 영화의 한 장면을 살기를 바란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물들은 유일한 사물이 되어주기를 욕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맥시멀리스트들은 좀 고약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물들 속에서, 결코 사물이 되지 않으려고, 사물을 놓지 못하는 희한한 역설을 살아야 한다. 아, 사물들이여, 나의 간수여!

'한뼘읽기'는 제주시에서 ‘금요일의 아침_조금, 한뼘책방’을 운영하는 노지와 삐리용이 한권 혹은 한뼘의 책 속 세상을 거닐며 겪은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다. 사전적 의미의 서평 즉, 책에 대한 비평보다는 필자들이 책 속 혹은 책 변두리로 산책을 다녀온 후 들려주는 일종의 '산책담'을 지향한다. 두 필자가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