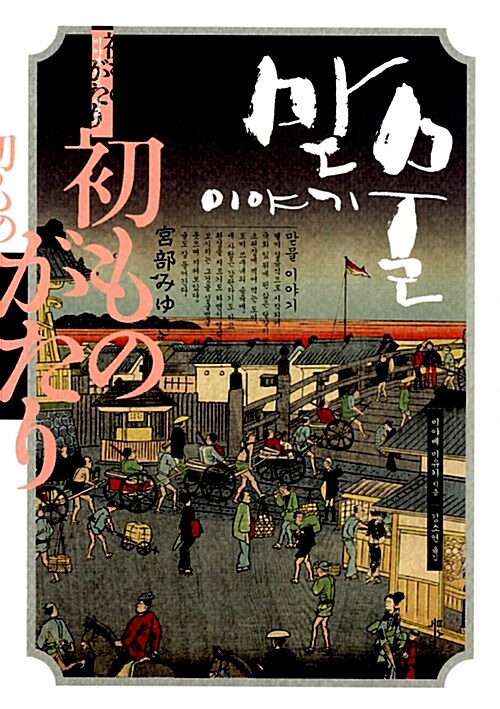
《맏물 이야기》는 일본 에도 시대를 무대로 한 미야베 미유키의 연작 소설 모음집이다. 영화 <화차>의 원작자가 이 미야베 미유키, 이른바 미미 여사다. 그는 자신의 추리소설을 일본 에도 시대로 끌고와 ‘미야메 미유키 월드’를 이룰만큼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맏물 이야기》로 처음 이 세계에 발을 들였고, 미미 여사의 세계관을 논할 깜냥이 없다. “미야베 미유키가 선보이는 꽤 맛있어 보이는 요리 미스터리!” 책 뒤표지에 실린 이 한 줄의 카피에 이끌린 입문자일 따름이다.
모두 9편의 작품이 수록된 《맏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캇피키’라는 직위를 맡고 있는 모시치다. 짐작건대 우리나라 수사 사극에 등장한 ‘별순검’ 정도의 위치와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곧 막부 시대에 영주에 고용되어 공공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던 하급의 사법 공무원 정도일 터이다. 어쨌든 그가 부하 둘과 함께 치정에서 살인에 이르는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이 연작들의 공통된 모양새다. 이 이야기들에는 제철 요리가 등장하고, 사건들은 각 요리에 빗대어 전개된다. 곧 요리가 일종의 은유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가령 <뱅어의 눈>이라는 작품을 보자.
겨울이 거의 그 끝을 보이는 2월 말은 뱅어 철이다. 마침 이 무렵 유랑하는 소년들이 부쩍 많아져 문제가 되고, 모시치와 몇몇은 그들을 단속하는 것보다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여겨 대책을 세우고자 애쓴다. 부자들의 선행과 자선에 기대볼 요량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 와중에 급기야 소년 다섯이 독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라는 게 밝혀지고 모시치는 물밑 협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사당을 짓겠다고 나선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모시치는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갓 잡힌 뱅어에 초간장을 뿌려서 꼴깍 삼키다시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뱅어회를 먹지 못하는 부하에게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한다. “그건 살아있는 생선을 먹는 게 아니다. 봄을 삼키는 것이지.” 이 말은 나중에 이렇게 달라진다. “데라우라 사건 이후로, 모시치 대장은 팔딱팔딱 뛰는 뱅어에 초간장을 쳐서 먹는 일이 없어졌다. 누가 어떻게 권해도, 그것만은 못 먹겠다며 거절한다고 한다.”
모시치가 이렇게 변한 것은 당연히 소년들 독살 사건 때문이다. 범인은 오유라는 부자집 아가씨인데, 그녀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을 자신의 정신질환 치유법으로 삼는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그에 대해 쉬쉬할 뿐 그 윤리성이나 잔인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급기야 그녀는 소년들을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죽이게 된다. 이런 사실은 모시치를 살아 숨 쉬는 것, 곧 생명에 대해 깨닫게 만든다.
“오유라는 아가씨의 눈에는……중략……아이들이 초간장이 뿌려지고도 아직 팔딱팔딱 움직이는 뱅어처럼 보일 뿐이었던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들이 바라보거나 그들을 바라보아도, 뱅어의 점 같은 눈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감정밖에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p.82)
제철 요리로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 것과 자신의 병을 이유로 살인을 하는 것, 곧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과 비윤리에 대한 따끔한 각성이다. 곧 미식과 살인은, 모시치의 뱅어회 에피소드에서는 닮은꼴인 셈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요리에 윤리 혹은 인간적인 그 무엇이 얹혀진다.
미야베 미유키의 ‘요리’가 이렇다면 ‘미스터리’는 어떨까? 그녀의 이야기 방식은 독자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건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작가가 이끌어나가는 방식이다. 작가가 완전히 한 상 차려서 손님/독자에게 내미는 식이다. 추리소설 혹은 문학작품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추리소설에서 탐정 혹은 수사하는 인물과 독자가 함께 범인을 찾아가는 ‘열린 구조’를 경험하기란 쉽게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아니다. 물론 ‘닫힌 구조’에서도 우리는 충분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닫힌 쾌락? 나도 은유로 한번 말해보고자 한다. 식당에서의 일상적인 풍경을 생각해보라. 메뉴에 적힌 것을 주문하고, 요리사가 전적으로 그 메뉴를 차리고는 손님에게 내민다. 손님이 요리에 끼어들 여지는 단 1%도 없다. 물론 손님이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도 많다! 그건 요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요리사는 신이고, 손님은 신민이다. 손님은 화폐라는 공물을 봉헌하고 작가/요리사로부터 음식을 하사받는다. 이 완강한 수직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미식은 기껏해야 투정밖에는 되지 않는다. 빵을 달라고 바스티유 감옥의 문을 열어젖힌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응석일 뿐이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과 맛있는 것을 달라는 게 어찌 같겠는가. 미식은 그런 점에서 바로크Baroque를 연상케 한다.
‘진부함’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단어인 매너리즘 예술 양식에 반발해 바로크는 태어났다. 감각적인 풍요로움과 생동감, 극적 효과를 통한 감정의 분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게 바로크다. 표준화된 맛이 아니라, 색다르고 맛을 찾는 사람들, 곧 미식가들은 우리 시대의 바로키언Baroquian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핏빛 빵이 아니라 갓 구워낸 맛있는 빵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탓하려는 말이 아니다. 미식에 유혹되는 삶은 너무도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이다!

'한뼘읽기'는 제주시에서 ‘금요일의 아침_조금, 한뼘책방’을 운영하는 노지와 삐리용이 한권 혹은 한뼘의 책 속 세상을 거닐며 겪은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다. 사전적 의미의 서평 즉, 책에 대한 비평보다는 필자들이 책 속 혹은 책 변두리로 산책을 다녀온 후 들려주는 일종의 '산책담'을 지향한다. 두 필자가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