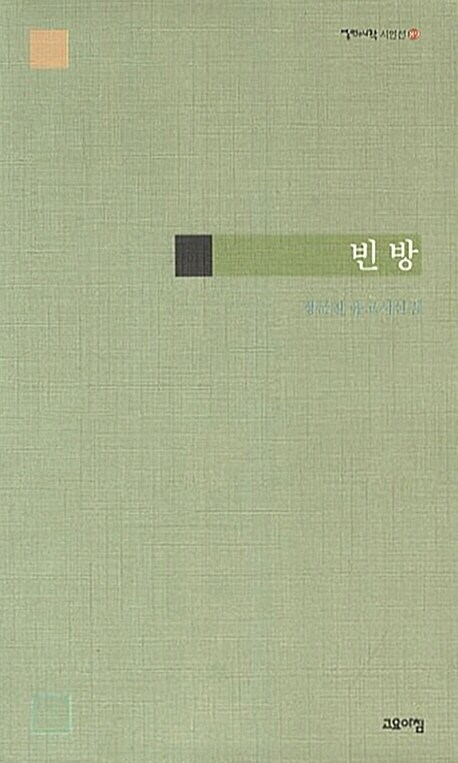
호프집에서 호프를 마시면서 희망을 말하는 건 쓸쓸한 일이다. 비 내리고 낡고 작은 가게라면 그 희망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호프집에 가면 호프집이라도 열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만만하게 봐도 그걸 다 받아주는 호프집. 내게 호프집을 하라고 말한 시인이 있다. 정군칠 시인이다.
정군칠 시인은 1952년 서귀포 중문에서 태어나 2012년 7월 8일 숨을 거두었다. 중문 별빛 내려앉은 베릿내에에서 별빛과 함께 흘렀다. 그는 시집 두 권을 냈다. 『수목한계선』(한국문연, 2003)과 『물집』(애지, 2009)이다. 첫 번째 시집 첫 장에는 그의 사진이 있는데, 강단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붉은 꽃 핀 잎사귀 넓은 식물 옆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팔짱을 낀 시인의 모습은 모슬포의 바람을 닮았다. 그는 모슬포에서 청춘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문학 장학생으로 진학을 할 정도로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으나 학교를 졸업한 뒤 시의 길을 가지 않았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지천명의 나이에 첫 시집을 냈다.
그가 머물던 삼덕빌라에 몇 번 갔다. 봄동배추가 맛있을 때라면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서 배춧국을 끓여주었다. 내가 시를 봐달라고 하면 수목원을 같이 걷자고 하고선 벤치에 앉아 에쎄 한 대 피운 뒤 시를 봐주었다.
삼덕빌라 그 집은 늘 깨끗했다. 오디오에는 레너드 코헨 엘피가 돌고 있었고, 시인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차를 마시는 탁자가 나무인데도 유리처럼 빛났다.
“선생님, 방이 참 깨끗하네요. 매일 청소하시나 봐요?”
시인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넌 매일 청소하지 않니?”
그는 시를 쓸 때도 깔끔함을 보였다. 우연히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본 적이 있었다. 초고, 미완, 완성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시를 쓰고 완성도에 따라 정리를 해놓는 것이다. 그는 늘 필사를 했다. 볼펜으로 옮겨 쓴 필사노트가 열 권 정도 구석에 쌓여 있었다.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 주례를 부탁드리려 정군칠 시인을 찾은 날이었다. 그때 그는 이미 병이 깊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주례를 거절하면서 그는 나를 걱정했다.
“호프집이라도 해야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시인의 길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봄 햇살이 빌라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를 새로 바꿀 계획도 말했다. 그러니 그가 중병에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부리 붉은 새들이/ 몇 번 찾아왔으나/ 여전히 입을 닫는 나무가 있습니다/ 새들은 꽃이 벙그는 순간보다/ 꽃을 내려놓는 순간을 기다립니다”(「동백 그늘」)라는 그의 시처럼 그는 입원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모습을 보이기 싫어 면회를 다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첫 시집을 내고 10년도 채 되기 전에 별세했다.
나는 그에게 산문집도 내 보라고 말했다. 잔망스러운 나의 말은 철없는 소리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며 한 번 웃더니 말했다.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시를 늦게 시작했으니 이 시 쓰기에만 전념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 시집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세 번째 시집은 유고시선집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동안/ 더께 진 아픔들이 왜 없었겠나/ 빛이 다 빠져나간 바다 위에서/ 생이 더욱 빛나는 집어등처럼/ 마르며 다시 젖는 슬픔 또한 왜 없었겠나”(「가문동 편지」) 하는 그의 시가 다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정군칠 시인에게 헌사를 하고 싶었던 나는 그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보았다. 시활짝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컴필레이션 음반에 그의 시 「가문동 편지」가 노래로 수록되었다. 노래는 가수 러피가 불렀다.
호프집의 호프는 발음으로는 Hope로 들리지만, 호프(Hof)는 농가, 농장 안마당을 뜻하는 독일어이다. 그 의미를 뒤늦게 알았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누군가의 시도 있듯이 잘못 들은 말이 희망을 만들었다. 아니면 원래 희망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찾았기에 희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호프집을 하고 새로 시집을 낸 정군칠 시인이 가게에 와서는 호프 한 잔 마시는 상상을 해본다. 이 얼마나 부질없는 상상인가. 정군칠 시인이 세 번째 시집을 내고자 했던 것, 새로 산 자동차를 타고 모슬포 바람맞으러 가고자 했던 것은 희망으로 그쳤지만, 그래도 그 소박한 희망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은 김신숙 시인과 현택훈 시인이 매주 번갈아가며 제주 작가의 작품을 읽고 소개하는 코너다. 김신숙·현택훈 시인은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부부는 현재 시집 전문 서점 '시옷서점'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 작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다양한 기획도 부지런히 추진한다. 김신숙 시인은 시집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동시집 『열두 살 해녀』를 썼다. 현택훈 시인은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음악 산문집 『기억에서 들리는 소리는 녹슬지 않는다』를 썼다. 시인부부가 만나고, 읽고, 지지고, 볶는 제주 작가와 제주 문학.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은 매주 금요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관련기사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청년의 마음으로 시를 만날 수 있다면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소설 무렵에도 따뜻한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쓰지 못한 시 한 편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뱅듸 위를 펄랑펄랑 날아다니는 제주어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환하고 곧고 단단한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후투티가 날아오는 섬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생각의 교환1
- [시인부부의 제주 탐독]나는 결국 이 사진으로 돌아왔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생각의 교환2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 우리는 어떤 세월을 지나고 있을까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제주의 노래여, 청청 거러지라 둠비둠비 거러지라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바다로 간 노루가 다시 돌아왔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 이제 만나 함께 가는 길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마지막회)]귀를 기울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