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의 기억을 가진 장소는 제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육지부로 끌려가 옥살이를 하거나 어떤 이는 타지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또 4·3 당시 한반도의 자주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인물,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 사회를 탄압했던 인물과 관련된 장소도 여럿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도외 4·3유적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록한 보고서 ‘바다너머 4·3 기억의 장소’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형무소와 학살터 관련 유적지 외에도 전국을 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4·3과 연관성이 있는 곳을 조사‧기록했다.
우선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4·3 관련 인물들의 묘역 등을 정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서울 현충원에는 4·3과 연관된 김명, 김정호, 문용채, 박진경, 김익렬, 안재홍, 이범석, 채명신, 채병덕, 최석용, 김용주, 최치환 등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대전 현충원에도 함병선, 선우기성, 유재홍, 문봉제, 이형근, 김두찬, 김창룡, 이세호, 서종철, 박창암, 박창록 등이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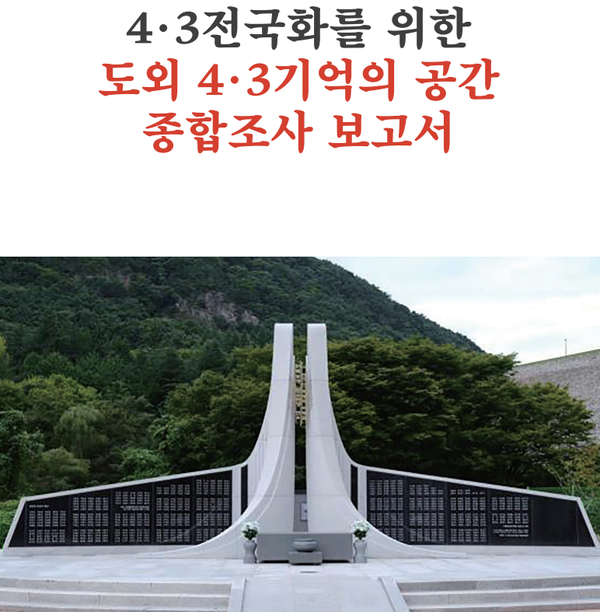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4·28 평화회담을 추진했던 김익렬 연대장 생가(경상남도 하동)를 확인했으며, 강원도 정선 지역 소위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 관련 증언과 위치도 파악됐다.
도외 4·3 유적지 조사단(단장 김은희)에는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김은희 조사단장은 “일부 미진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형무소와 학살터 중심에서 4·3과 연계된 장소와 인물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도외 4·3유적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기록이 왜곡되거나 4·3 관련 이정표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기억이 소멸되기 전에 종합적인 기억의 공유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사업위는 ‘4·3이 뭐우꽈’ 앱에도 도외 4·3 유적지 43곳을 선정해 위치 정보를 연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