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예정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차기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열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21개국의 대사,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한 협약가입국 196개국의 대표단 등 약 2,200명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국제사회에 다시 알릴 기회이자, 유산 보전의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계기다. 아울러 다수 외국인이 방문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된다.
개최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하나도 없는 도시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개최지 선정이 매우 이례적인 이유다. 제주도는 부산과 경쟁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개최지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도 왜 부산에 밀렸을까?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 분위기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포괄한 지역으로서 국제적 정당성을 갖췄고, 회의와 숙박을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자부해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듯한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오히려 부산의 준비 과정을 보면,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시는 유치 준비를 위해 시 관련 부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연구원과 함께 유치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공모에 임했다. 유치제안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부시장이 평가발표에 직접 나섰고, 현장 실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실사단을 접견했다.
부산시는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인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역사적 맥락을 활용해, 향후 부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구상까지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주 등 인근 지역의 세계유산과 연계한 ‘부울경 유산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면서 유치 전략의 범위를 넓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한 유치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중앙 정치권과 협업하는 모습은 절실함과 조직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반면 제주도는 어땠을까?
회의 유치 실무는 세계유산본부가 맡았고, 현장 실사 시 실사단을 맞이한 인사도 본부장이었다. 실사단의 제주 방문은 6월 16일, 부산 방문은 6월 17일로, 제주가 첫 방문지였던 만큼 더욱 인상 깊은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실무 중심의 대응에 그쳤다. 부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제주는 유치에 대해 간절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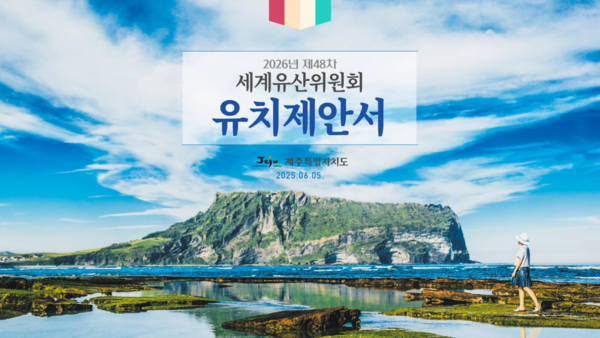
유치 제안의 내용도 차이가 컸다. 부산은 ‘평화’를 중심으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향후 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설계했지만, 제주도는 ‘세계유산 보유 지역’이라는 사실 외에 뚜렷한 메시지가 부족했다. 유네스코 유산 보전을 선도하겠다는 선언도, 제주 4·3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구상도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단순히 유산이 있다는 이유,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 과연 실사단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따지고 보면 준비와 연계된 문제다. 부산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냈고, 실질적인 유치지원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3인에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실행에 옮기게 했는가? 만약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 이는‘정무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도정의 정치적 능력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이번 유치 경쟁은 부산의 준비성과 전략이 제주를 앞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외부 요인 탓만 한다면 제주도민과 부산시민 모두에게 예의가 아니다. 패인은 안에서 찾고, 교훈은 내부 성찰을 통해 얻어야 한다. 제주도정이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 정교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갖추고 각종 국제회의 유치전에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