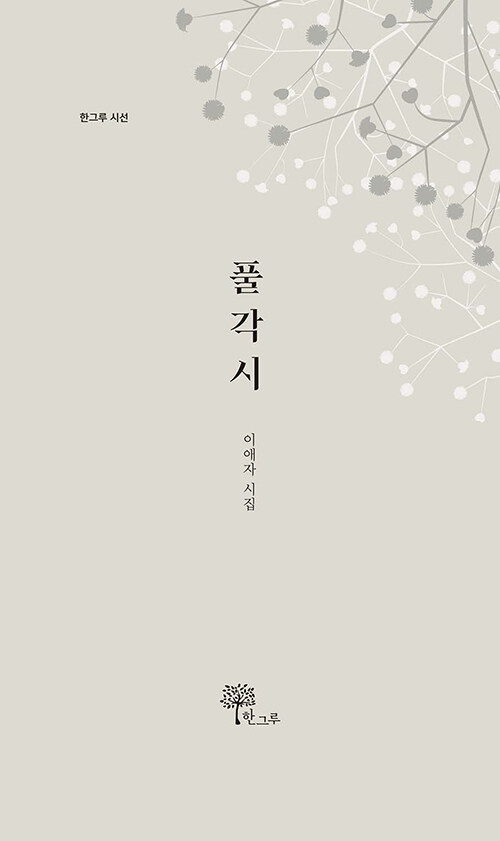
이애자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은 단시조가 주를 이룬다. 몇 해 전에 이애자 시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시조(평시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단시조야말로 시조 형식의 정수이기에 단시조로 시조의 멋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책에 수록된 단시조 「입」, 「초승달」, 「단호박」, 「제주 사람」 등을 읽으면 그의 시론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시조를 잘 모른다. 시조는 글자 수를 지켜야 하는 정형시 정도로만 생각했다. 시조인지 확인하려면 음수율과 음보율을 따지는 게 우선이었다. 시조가 고려 말엽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통 시가 형식이라고 하지만, 시조의 유구한 시간이 쌓여 어떻게 현대시조가 되었는지 여전히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문학의 전통성에 관한 글을 보면 시조가 자유로운 시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조가 자유로운 시 형식이라고?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는 게 시조인데 어떻게 자유로운 형식이 될 수 있을까.
3·4조의 음수율에서도, 초장·중장·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쓸 때도 허용 가능한 수들이 있다. 그러니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것. 숨통을 열어놓은 셈이다. 현대시조에 이르러서는 그 자유가 더욱 활기를 띤다. 굳이 시조를 쓰는 까닭을 모를 정도로. 하지만 시조를 쓰는 까닭에 대해서 고정국 시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롯해 우주의 모든 질서는 정해진 운율로 이루어졌으니 시조를 쓸 수밖에 없다고.
이후, 시조는 엇시조와 사설시조를 거쳐 현대시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평시조에서 나타나는 맛깔스러운 음률을 음미할 수 있다. 그 점을 나는 이애자의 작품에서 여러 번 발견했다. 시조의 풍미는 여전히 평시조에 남아있다.
이애자의 시조 「초승달」을 보자. “탄 한 장 아끼려고 수시로 일어나/ 겨울을 조절하시던 어머니의 불구멍/ 마지막 잔불로 남은 새벽별이 지네요”(「초승달」 전문)
단시조의 형식을 지키면서 어머니의 삶을 모두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식구들을 위해 ‘겨울을 조절’하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노년에 ‘잔불로 남은’ 어머니는 ‘새벽별’로 은유된다. 애잔하다.
이 시집에는 생활 소재를 사용한 시조들도 꽤 있다. “끓어올라 으깨져// 주저앉고 싶을 때// 졸이던 맘 잘 저어// 뭉근해지길 기다려 보라// 점성은 끈끈해지고/ 관계는 달달해져”(「잼 만들며」 전문)처럼 목화, 옷, 수박, 재봉틀, 두루마리 휴지, 이쑤시개 등 일상의 사물을 통해 시를 보여준다. 시조가 시절을 노래한 것이니 모든 사물에도 계절이 있겠다.
“나무는 죽에서도 모든 장기를 내어놓는다/ 견딤의 흔적마저 두루 말아 표백해버린”(「두루마리 휴지」 부분) 이 시를 읽고 난 뒤 두루마리 휴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겠다. 두루마리 휴지가 나무의 장기(臟器)라니.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섬뜩한 감각이다.
표제시 「풀각시」에서는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쌍무덤 상석에 앉아 넌 어멍 난 아방”하는 오누이 모습을 보여준다. 풀각시는 풀로 만든 인형으로 주로 소꿉놀이를 할 때 쓴다. 소꿉놀이에는 희망 사항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슬픔을 안은 모습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흐뭇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시인도 모처럼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이 시집의 뒷부분은 모슬포에서의 삶과 4·3이 모슬포 모래바람처럼 흩날린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서성거리는 이애자 시인이 보이는 것 같다.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은 김신숙 시인과 현택훈 시인이 매주 번갈아가며 제주 작가의 작품을 읽고 소개하는 코너다. 김신숙 시인은 시집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동시집 『열두 살 해녀』를 썼다. 현택훈 시인은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음악 산문집 『기억에서 들리는 소리는 녹슬지 않는다』를 썼다. 두 부부가 만나고, 읽고, 지지고, 볶는 제주 작가와 제주 문학.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은 매주 1회 게재한다.<편집자 주>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시인의 바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귀신이 무서울까, 글자가 무서울까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현지인의 휴가법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수박은 함께 먹을 때 맛있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해녀와 수필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이름까지 묻혀버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초창기 마음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 이제 만나 함께 가는 길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바다로 간 노루가 다시 돌아왔다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제주의 노래여, 청청 거러지라 둠비둠비 거러지라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 우리는 어떤 세월을 지나고 있을까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 바람이 숨결이 될 때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이상하고 아름다운 섬에서
- [시인부부의 제주탐독(마지막회)]귀를 기울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