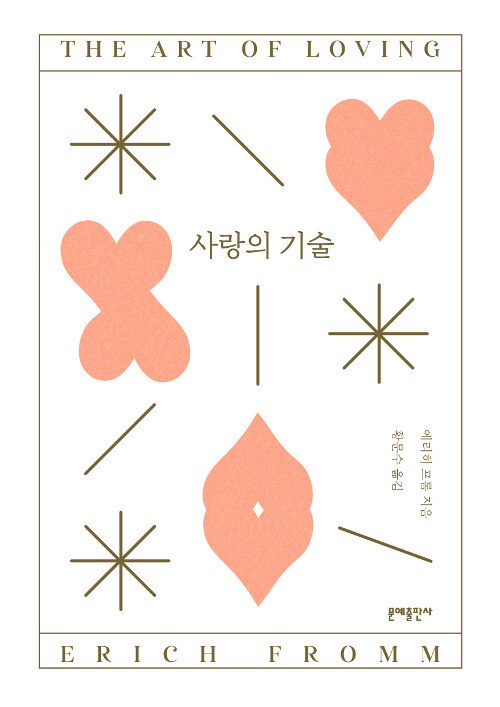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냥 느낌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알 뿐이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랑은 말없이 서로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배워서 알아야 할 느낌이라고 말한다.
프롬은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다. 그는 사는 동안에 스스로 사랑을 찾으려 애썼다. 혼례를 몇 번 치르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삶을 살았다. 이 책은 1956년에 나왔다. 그이 나이 56살 때다. 그는 이미 ‘자유로부터의 도피(1941년)’, ‘자립적 인간(1947년)’, ‘정신분석과 종교(1950년)’, ‘잊어버린 언어(1950년)’, ‘건전한 사회(1955년)’ 라는 책을 썼다. ‘사랑의 기술’ 은 앞에 쓴 책들을 새롭게 다듬은 것이다. 프롬 책 가운데 꼭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이 아닐까 싶다.
이제 ‘사랑의 기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자. 부부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 날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글쓴이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알아야지 부부 사이에도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쓰지 않는다든지, 빨래거리를 아무 곳에나 둔다든지 하는 일에서 말다툼이 일어난다. 또 아내는 잠을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남편은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서로 불편함을 느낀다. 프롬은 말한다. 이런 일들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다툼을 없애려 하면 서로 사이가 멀어진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꼭 다툴 일이 있다. 아내, 남편이 살아오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 두었던 어떤 것을 풀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것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올곧게 사는 일은 무엇인지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삶이다. 바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 그런 물음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서슴없이 다가가야 진정한 사랑이 돋아난다. 참 힘든 일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같이 사는 사람과 생각을 나누라니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에리히 프롬은 그 아픔을 겪어야만 아내를, 남편을 속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말한다.
이런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은 같이 사는 식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과 멀리 사는 지구 마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더욱 이루기 힘들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지금 사회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제 목숨을 구하느라 바쁘다. 사회가 지옥이 되고 있다.
프롬이 쓴 글을 보자. “사랑은 인간, 동물, 식물 안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삶에 대한 사랑은 추상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모든 종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핵심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욕망하고 원하고 집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랑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에리히 프롬은 평생을 핵무기, 핵발전소, 핵전쟁,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글을 썼다.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책은 아무리 잘 옮겨도 30%쯤은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옮긴이가 프롬이 쓴 다른 책도 옮겨서 그런지 잘 읽혔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서, 가까이 있는 모든 목숨붙이들을 아끼고 섬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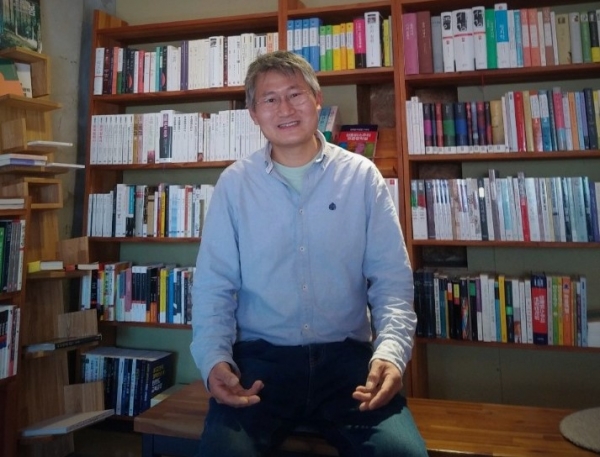
글쓴이 은종복 씨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 책방 '제주풀무질'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책과 사회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또밖또북] 코너로 매달 마지막 주에 독자들과 만난다.

